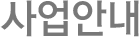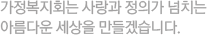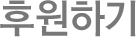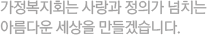|
"유영이 몸에 경직이 왔어"
둘째 딸이 태어나서야 유영이가 다른 애들과 달랐다는 걸 깨달은 부부는 자신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둘째 유현(가명‧11)이의 성장 속도는 유영이와 확실히 차이가 났다.
유현이도 언니를 돌보는 데 선수가 됐다. 유현이는 누워만 있어 하루 종일 심심했을 언니 옆에서 자신의 일상을 재잘재잘 이야기하기 바쁘다. 그런 동생의 마음을 아는지 유영이는 유현이만 보면 웃는다고 한다. 요즘은 언니 자랑에 신이 났다. 부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 언니는 조금 아프지만 잘 웃고 예쁜 언니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발표했다는 유현이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
배주현 기자 pearzoo@imaeil.com 대구경북 거주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전화 053.287.0071 |